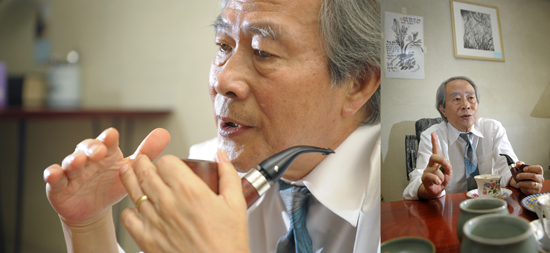[한국초대석] 소설가 박상륭깊이 있는 사색·복합문체·관습 깬 형식으로 한국 소설의 새 지평 열어
그러나 그의 소설을 몇 번이고 곱씹어 언어의 틀을 걷어내어 보면, 동서양 철학을 망라하는 작가의 사색이 전율로 다가온다. 깊이 있는 사색과 복합 문체, 소설의 관습을 깬 형식은 한국 소설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학평론가 김정란은 “박상륭은 당대에는 가장 고독하고, 그리고 후대에는 가장 오랫동안 무덤에서 불려 나올 작가(계간 <작가세계> 97년 가을호)”라고 평한 바 있다.
1969년 캐나다 이민 후,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던 그가 <잡설품>을 발표한지 일 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문학은 잡설이에요
“아, 늙은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전화 수화기 너머로 독특한 전라도 사투리가 들린다.
“<잡설품> 비롯해, 선생님 작품에 대해 말씀 듣고 싶은데요.”
“아, 그건 좋지요. 내, 이 여사 생각도 들었으니끼니.”
몇 주 전 몇몇 시인들과 술자리에서 박상륭 선생은 젊은이 못지않은 주량을 과시했었다. 선생의 서울 자택은 생각보다 검소했는데, 좌식 테이블로 꾸며진 거실 한쪽에는 작고한 문학평론가 김현이 선생에게 보낸 동양화 한 점과 구본창 화백의 작품이 걸려있었다. 그 밤, 시인들은 더 이상 시를 읽지 않는 시대를 한탄했고, 달라진 문학 시장을 이야기 했다. 듣고 있던 선생이 나직이 말했다.
“문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독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쉽게 써야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독자를 우롱하는 거예요. 독자의 수준을 낮춰보는 거죠. (작품을 쉽게 쓰는 건) 긴 눈으로 보면 독자를 모독하고 독자를 배반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 문학의 높이를 가늠할 수 없을 때 까지 나아가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슬픈 현상이에요.”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 문학은 하나마나 한 잡설이에요.”
선생은 맥주에 소주를 타주며 연신 “어서 드시라”고 술을 권했고, 밤이 깊어 선생의 댁에서 나온 젊은 시인들은 얼큰하게 취해 돌아갔다. 선생은 젊은 시절부터 엄청난 주량을 자랑했다는데, 그의 벗이었던 작고한 소설가 이문구는 그를 두고 “죽어서도 술 없는 천당보다 술 있는 지옥행을 자원할 주선(酒仙))”라고 쓴 적이 있다.
다시 선생의 집을 찾던 날, ‘문학은 잡설’이라던 선생의 말을 되물었다. 지난해 출간한 책의 제목 역시 <잡설품>이지 않던가.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작품은 <죽음의 한 연구>,<칠조어론>에 이어 그의 작품세계를 맺는 완결편으로 꼽힌다. 완연한 소설 형식에서 벗어난 ‘잡설’의 문학. 그가 이런 형식을 고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소설을 순수문학(literature)과 대중문학(fiction)으로 나눈다면, 순수문학의 의미에서 더 이상의 좋은 소설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소설이 한계에 도달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지금 쓰는 것은 예전 작가들의 작품을 재활용하는 셈인데, 더 좋은 문학작품이 나오리라는 건 기대가 안 되지요. 그럼에도 옛날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승전결 법칙에 의해서 소설을 쓰는 건 대단히 고전적인 태도라고 봐야겠지요. 문학의 생성을 위해서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전 소설 법칙은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소설의 제목으로도 쓴 ‘잡설’은 소설과 철학과 경전, 모두를 아우르는 텍스트를 이르는 말이다. 아마 그가 추구한 문학도 이와 비슷한 모양새일 것이다. 그가 써낸 일련의 작품들은 완연한 소설의 형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문학인 셈이다.
박 모는 동양의 문학을 했습니다
평론가들은 그의 작품세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1960년대 발표한 30여 편의 중단편이 1단계라면, 1975년 발표한 대표작 <죽음의 한 연구>가 2단계, 1990년대의 <칠조어론>와 지난해 발표한 <잡설품>을 각각 3, 4단계로 나눈다.
초기 중단편을 비롯해 <죽음의 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은 기독교적 사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죽음의 한 연구>에서 기독교적 사유 체계가 완성되며, 한편으로 불교의 한 갈래인 ‘밀교적 정신세계’를 작품의 근간으로 삼았다. <칠조어론>에서 기독교적 사유는 지양되고 선불교적 사유가 기저를 이룬다.
<잡설품>은 <죽음의 한 연구>의 무대인 ‘유리’(호동湖東= 동양東洋)에서 호서(湖西= 서양西洋)로 건너간 순례자가 주인공 시동(호서의 구도자)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의 작품을 읽기 위해, 독자는 필수적으로 종교적 사유를 거쳐야 한다.
“박 모 선생(박 작가 자신)은 아주 젊어서 단편 몇 편 썼을 때 한국문학을 했고, 종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문학이 아니라 동양의 문학을 했습니다. 동양의 문학을 했다는 건, ‘마음의 우주’의 문학을 했다는 말이 되요.”
|
이 아리송한 대답의 뜻을 풀기 위해, 또한 그의 ‘잡설’들을 곱씹어보아야 했다. 그가 발표한 작품을 두고 평론가들은 흔히 ‘몸의 우주, 말씀의 우주, 마음의 우주’라고 말한다. 세 단계의 우주란 무엇인가.
희랍 신화에서 파생한 ‘몸의 우주’는 육신의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이 우주에서 거듭남(부활)은 없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성경에서 파생한 ‘말씀의 우주’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드러낸다. 말씀의 우주에서는 영생, 두 번의 거듭 태어남이 있다. 마음의 우주는 불교적 가치관이다. 마음의 우주에 이르면 해탈을 위해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는 윤회가 있다.
거듭 태어나면서 이 우주의 존재는 진화를 이룬다. 작가는 단계적으로 진화해서 해탈에 이르게 하는 ‘?(몸과 마음의 합쳐진 말)’론을 작품에서 설파한다. <죽음의 한 연구>에서는 제목 그대로 죽음과 삶의 관계에 천착했다. <칠조어론>에서는 고행을 다루었고, <잡설품>에 이르러 해탈에 관한 내용을 써냈다. 작가의 작품 자체가 ‘말씀의 우주’(기독교적 세계관을 다룬 초기 작품)에서 ‘마음의 우주’(해탈에 이른 후기 작품)로 나아간 셈이다.
그의 작품을 난해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문체다. 복합문체(複合文體 : 한 문장에 여러 문장이 있는 문체) 또는 복의문체(複意文體 : 한 문장에 여러 뜻이 있는 문체)라고 일컬어지는 그의 글은 한 문장이 평균 400~500자를 넘어선다. 길고 긴 그 이야기에는 또한 운율이 있다. 국내 문학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독특한 문체는 중고등학생 시절 500 여 편의 시작(詩作)에서 비롯된 훈련의 결과인 듯싶었다. 이 탁월한 문장을 갖고서, “왜 시인이 아니고, 소설가가 됐느냐?”고 물었다.
“시는 낙엽 한 장 넣고 꽃잎 한 장 넣고, 달 한조각 가위로 잘라 넣고, 그 밑에 꽃뱀 한 마리 넣으면 가득 차는 바구니입니다. 소설의 바구니는 무한정하죠. 천체물리학, 경제, 학문, 철학, 뭐든지 들어가는 바구니죠.”
추상도 현실의 한 형태죠
사유의 극한을 보이는 그의 작품을 현실에 대입할 수는 없을까. 작가는 “현실을 하나로 한정짓는 건 잘못된 관찰의 결과”라며 “현실론은 새로 조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도 개인적 현실, 사회적 현실, 종교적 현실과 같이 여러 층위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독자가 추상의 사실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추상이 인간 현실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아마 그의 다음 작품에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볼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담은 자이나교 교리에 빗댄 작품을 구상 중이다. 사회가 양극단으로 분열된 현상에 대한 우화를 쓰고 있다고.
“요즘 제일 두려운 거는 이 시대의 ‘지적 정예’(행동하는 지식인)에요. 군중은 군중의 자아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위험하죠. 어떻게 정신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휩쓸려 가는데, 언제든 군중 앞에 지적 정예들이 서 있죠. 그 나라 지적 정예들이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좋은 정책 없이 무조건 가담해서 투쟁하면 군중의 정신이 흔들리게 되죠. 지금의 지적 정예들이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문학의 위기를 말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작가는 무엇을 해왔는가. 문학평론가 겸 시인 김사인은 2001년 <박상륭 깊이 읽기>를 엮으며 이 책 첫 머리에 “존재의 근원과 맞서 ‘글쓰기’의 형식으로 치러지고 있는 박상륭의 고투는 가히 영웅적이라고 할 말하다”고 썼다.
근대문학의 독법에 익숙한 독자들은 박상륭의 작품을 읽어 내지 못한다. 서정과 서사, 내용과 형식, 문학의 좌표를 넘어선 어느 자리에서 그의 작품은 피어난다. 바로 그 불편함이 역설적으로 그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
|
1963년 <아겔다마>로 사상계 신인상 입상, 데뷔 1967년 사상계 입사 1969년 캐나다 이민 1971년 <박상륭소설집> 출간 1975년 <죽음의 한 연구> 출간 1982년 캐나다에서 서점 'Readers Retreat' 개업 1990년 <칠조어론> 제 1 권 출판 1991년 <칠조어론>제 2 권 출판 1992년 <칠조어론>제 3 권 출판 1994년 <칠조어론>제 4 권 출판 1999년 소설집 <평심>, 산문집 <산해기> 발표 (문학동네) 2008년 <잡설품> 출간 |
이윤주 기자 miss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