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김원우 펴내중문과 복문 얽힌 특유의 문체로 지식인 사회 비판 세 편의 이야기

가짜 사회에 날리는 직격탄
사회 초년병들에게 금과옥조로 전해 내려오는 '인생 선배'들의 조언 중 하나는 "상사에게 직언하지 마라"는 것이다. 소위 바른 말이 제가 몸담는 조직에 득이 된다 해도 상사 기분을 거스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만에 하나 상사가 그 언짢은 기분을 감추고 조언을 실행에 옮긴다고 해도 이득은 '1/n'로 끝날 테니, 공연히 '찍혀가며' 피곤하게 살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대중의 취향도 이와 비슷해서 쓴소리 하는 유명인들은 '좀 안다고 잘 난 체하는' 무리로 묶이기 십상이다.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겸손을 강조하는 특유의 유교문화가 만든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독설이 유행하는 걸 보면 꼭 그 때문만도 아닌 것 같다. 욕하는 대상이 청자가 아닌 제 3자로 향할 때는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헌데 어떤 사람이 대놓고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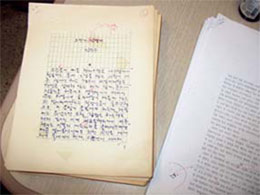
이 말은 작가 김원우 씨가 어느 신문의 서면 인터뷰에서 답변한 내용 중 일부분이다. 사회 갈등과 모순을 장문으로 비꼬는 그의 소설을 오늘날 젊은 독자는 읽기 버거워하는데, 이를 두고 작가는 "그들의 세계관에 아첨을 떨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한다.
그는 중문(重文)과 복문(複文)이 얽힌 특유의 긴 문체가 저항감을 일으킨 탓이라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지면을 빌어 이렇게 답한다. 이 소설이 최근의 젊은 독자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 것은 문체보다 작가의 꼬장꼬장한 반골적 기질,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는 불편함에 있다고 말이다.
물론 이 기질은 작가 자신에게도 향하고 있다. 신간 <돌풍전후>는 한편의 장편(돌풍전후), 두 편의 중편(나그네 세상, 재중동포 석물장사)이 묶인 연작소설집이다. 세 편의 이야기는 인물, 사건, 배경이 모두 판이하게 다르지만 대학사회로 대표되는 한국의 지식인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지식인' 일반을 흔히 '먹물'이라고 비아냥거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음은 그들이 파지하고 있는 지식 그 자체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워낙 알량해서입니다."

신군부가 광주에서 저지른 만행이 뒤늦게 전해지고, 교수사회는 '신군부가 교수 정원의 3할에서 절반까지 솎아낼 계획'이란 유언비어가 떠돈다. 진중하지만 염치를 지키려다 보니 왕따 신세인 임 교수는 80년 봄의 해방감 속에 동료 여교수와 애정 행각을 벌인다.
작가 초기부터 줄곧 견지했던 사실주의적 창작방법론, '지금 여기'의 이야기를 빌어 인간 세상을 드러내는 그의 문학관은 신작에서도 투영된다.
기실 김 씨만큼 지식인의 자의식에 대해 고민하는 작가도 드문데, 이는 그 소설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임 교수가 단 한 명의 독자, 한 교수에게 보내는 자서전 형식을 통해, 작가는 글쓰기의 효용과 글을 통해 허구가 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 나아가 허구가 현실을 넘어서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독자에게 던지고 있다.
"지금 우리 소설이 세계화되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번 소설에서 내가 비판했지만, 오에 겐자부로의 소설에는 일본 특유의 찐득찐득한 정서가 있지요. 그리고 오에 말고도 일본에 좋은 작가 많은데 그 작가들은 일본사회와 정식으로 대결하거든요. 그 비판의식에서 소설이 꿈틀거리고. 근데 한국사회가 갈등 구조가 많은데 말장난에 그치잖아요?"
꼬인 문장에 담긴 비판 가락
이 깐깐한 기준은 자신의 작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작품을 쓸 때 구성을 미리 머릿속에서 굴려요. 제목, 인물도 시간 날 때마다 만들고…. 플롯이 머릿속에 짜여있죠. '전체는 3장이다, 도입부는 어떻게 하겠다, 정점은 어떤 방식으로 나가겠다.' 노트에는 잊어버릴 것들만 적어두는 편이죠. 방학이 되면 하루 10매 내외로 본격적으로 써요. 700매 내외로 생각했는데, 초고가 681매니까 거의 생각한 대로 쓴 거죠."
아직도 육필원고를 고집하는 그는 초고가 완성되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옮겨 2~3회 수정을 거듭한다. 진득한 고유어, 대구 변두리 지역의 투박한 사투리가 만연한 그의 소설은 '한 땀 한 땀' 수 놓인 장인의 물건을 연상케 한다.
여전히 책을 읽다 모르는 단어나 숙어를 적어두고 작품 쓸 때마다 참조한다. 그렇게 만든 단어장에 10권이 이른다. 그러니 독자가 김 씨의 소설을 읽으려면 우선 중문, 복문의 긴 문장에 익숙해져야 한다.
"나는 소설이 비판적인 언어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 비판을 단문으로 쓰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복문으로 비비 꼬면서 문장 자체에 비판적인 가락, 해학적 가락이 있어야 하죠. 아이러니를 넣으려면 중문, 복문이 섞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은 내 문학관인 것이죠. 단문에 익숙한 오늘날 독자는 달려들기 힘들죠. 근데 나는 독자한테 작가가 아부 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영향이 있는데, 횡보 염상섭 초기 문장이 아주 긴 문장, 복문과 중문을 많이 썼어요."
줄곧 시민사회의 속물적 삶의 이면을 해부하는 데 집중했던 김 씨는 작가 본인이 지방 사립대 강단에 서게 된 후 대학사회를 주된 이야기 무대로 삼는다. 이 소설집 전에 냈던 <모서리에서의 인생독법> 역시 의과대학 교수의 이야기.
<돌풍전후>의 임 교수나 임 교수와 애정행각을 벌인 심 교수, 그의 편지를 받은 한 교수가 모두 작가의 분신처럼 읽히는 이유다. "작가를 주인공으로 삼는 젊은 작가들의 사소설과 무엇이 다른가?"란 질문에 "모든 작가는 어떤 식이든 자신을 까발릴 수밖에 없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사실주의 소설의 대가 플로베르도 '마담 보바리는 나다'라고 했잖아요. 작가는 자기를 희화화시켜야죠. 필립 로스 소설 속 인물도 다 작가 본인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를 희화화시켜서 '내가 왜 여기 살고 있는가?'를 분석해야죠."
내년 대학을 은퇴하게 되면, 또 다른 작품세계가 열릴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장편을 선보인 김 씨는 이달 남성잡지
"지금은 학교에 몸담고 있으니까 내가 모티프 얻는 거나 잘 쓸 수 있는 부분이 대학사회죠. 조만간 서울에 가면 전혀 다른 작품이 나오겠죠. 요즘에는 말이 길어져서 단편으로 생각한 소설도 가지를 뻗어나가, 중편으로 쓰곤 했는데, 앞으로 단편도 꾸준히 쓸까 생각합니다."
글·사진 이윤주 기자 misslee@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