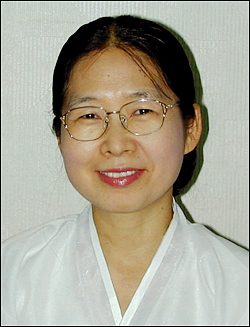
“아빤 작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대학 연구소에 근무하고 계세요. ”
며칠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성의 말이다. 남편을 몹시 자랑스러워하는 이 여성은 언제까지라도 기세 좋게 남편 얘기를 늘어놓을 셈으로 보인다. 진행자의 물음을 듣지 못하고 출연자의 말만 들은 사람은 자랑하는 대상이 남편이 아닌 아버지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그저 잠시 듣기만 하는 청취자도 거북하게 느껴지는데 그 여성을 바라보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의 고충은 얼마나 클까 싶다.
남편은 아내와 같은 급인지라 남편을 높이면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되고, 또 청취자 중에는 그 남편보다 위에 있는 분도 많을 텐데…… .
물론 말하는 상대가 손아랫사람이거나 누군지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수가 듣는 방송 대담에서 말끝마다 남편을 떠받드니 듣기 거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강 씨 옆에 있던 채 씨에게 묻는다
“채○○ 씨 남편께서는요?”
“현재는 직업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해 보려고 매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데 뜻대로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채 씨의 말이 앞의 강 씨보다 더욱 정감 있고 신선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예법을 제대로 지켜 말했기 때문이다.
부부는 서로 간에는 존대하면서도, 그 사이는 무촌(無寸)이므로 남에게 말할 때에는 자신을 대하듯 남편도 높이지 않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예법이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가리켜 ‘아빠’라 부르는 것은 괜찮을까. 이 역시 화법에 어긋난다. 예절 전문가는 자신을 낳아 준 ‘아버지’, ‘아빠’란 말을 남편에게 쓴다는 것은 예의 문제를 넘어 존속(尊屬)을 모독하는 일이라고까지 하였다.
언어 예절을 다루는 화법 전문가와 국어 전문가로 구성된 화법 위원회의 위원 대부분도 남편 지칭·호칭용 ‘아빠’ 사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어린 자식 앞에서 아이의 자리에서 ‘아빠’라고 할 수는 있다고 했다.
남편 호칭·지칭으로 ‘아빠’를 즐겨 쓰는 사람들은, 아이 이름 뒤에 ‘아빠’란 말이 붙었다가 아이 이름이 생략되고 ‘아빠’만 남은 것이니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남에게 기대어 부르는 일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남편의 누이동생에겐 ‘아가씨’, 남동생에겐 ‘도련님’이라고 해야 하는데, 아이에게 기대어 ‘고모’, ‘삼촌’으로 부르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의사나 교수로 성공한 아들을 둔 부모가 남 앞에서 그 아들을 가리켜 환자나 학생처럼 ‘우리 의사 선생님’, ‘우리 학장님’으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뜻있는 많은 분이 남편을 ‘아빠’로 부르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방송국에서도 여성 출연자에게 친정 아버지는 ‘저의 친정 아버지’로, 남편은 ‘제 남편’으로 구분해서 사용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출연자가 부적절한 ‘아빠’ 소리를 끝내 못 고칠 때에는 방송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말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남편을 ‘아빠’로 부르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버지와 남편을 ‘아빠’ 하나로 부르는 것도 문제지만 누구를 지칭하는지 듣는 사람이 혼란스러워할 것도 생각해야 한다.
김희진 국립국어원 국어진흥부장 hijin@mc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