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인하대 녹색금융대학원 주임교수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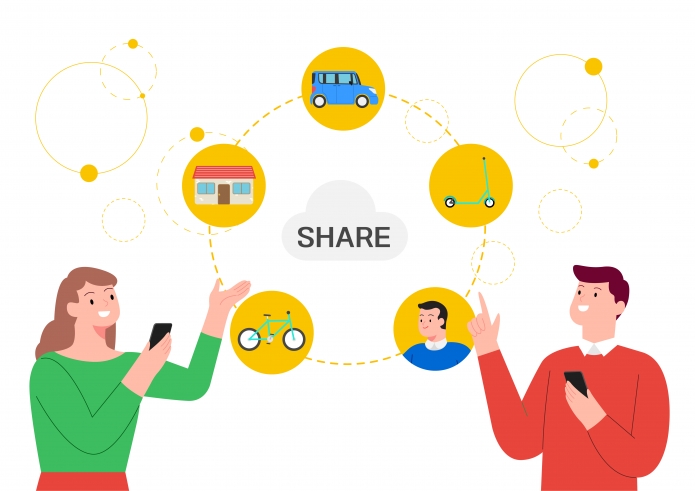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열풍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시장자본주의의 논의에 있어 1980년대는 중요한 변곡점이 된 시기였다.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대두돼 온 기업과 경제 성장 중심의 시장자본주의 사고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더욱 구체화되고 개념화됐다.
1984년 프리맨(Edward Freeman)은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를 발간해 학계와 산업계에 이해관계자와 기업의 관계에 관한 토론에 불을 지폈다. 주주와 채권자를 포함해 소비자, 종업원, 공급업체, 지역사회, 시민단체, 정부 등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기업과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이해관계자의 전략적 관리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1897년 UN 보고서 ‘Our Common Future’로 이어졌고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담당할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IPCC)이 설립됐다. 이후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노력은 이어졌고 이것이 기업의 경영방식과 철학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최근에는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큰 흐름(megatrend)으로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개념이 태동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자 가장 현실적이고 임박한 인류의 위기가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이슈인데 다른 이슈들에 비해 관련 이해관계자의 정의가 애매하다. 예를 들면 소비자, 협력업체, 종업원, 지역사회 등의 이슈에 있어 이해관계자는 각각 소비자, 협력업체, 종업원, 지역사회 주민들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정의는 덜 명확하다.
환경 시민단체와 규제기관이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완화 또는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결국 이해관계자는 미래 세대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UN 보고서 ‘Our Common Future’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정의할 때 미래 세대가 우리 세대만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0년대에 대두된 개념이 자연자본주의(natural capitalism)다. 1999년 폴 호켄(Paul Hawken) 등의 저서 ‘Natural Capitalism: Creating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은 기업의 환경 경영과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는 시장은 자연 자본과 인적 자본을 과소평가하고 남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특히 자연자본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거나 또는 거의 공짜(자유재)라는 인식과 현실이 자연자본을 고갈시키므로 그들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자본주의 구조 내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즉, 자원생산성 향상, 생체모방(biomimicry), 제품서비스화(product servitization) 등을 위한 친환경 제품설계(DfE, design for environment)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시장자본주의가 당면한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전생애주기(lifecycle)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오직 1%만이 그 본래의 목적인 사람의 이동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차 자체의 생산과 이동에 사용된다. 그리고 그 해결책 중 하나로서 자동차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제공하는 서비스, 즉 이동성(mobility)을 상품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 영향으로 최근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이 자동차가 아니라 모빌리티를 제공한다는 경영 비전과 전략을 가지게 됐고, 경제시스템에 있어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개념으로 진화돼 왔다.
공유경제는 소유에서 사용(공유)의 개념으로 진화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은 높이고 자원 사용과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는 혁신적 경제시스템으로 각광 받게 됐으며 동시에 그것은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해 우버(Uber), 리프트(Lyft), 에어비엔비(Airbnb) 등과 같은 차량 및 숙박 공유시스템의 탄생을 가져왔다.
하지만 초기 공유경제 모형이 평등주의와 상호 호혜에 기초한 개인 간 (peer-to-peer)거래에 기반을 뒀던 데 반해 점점 거대한 플랫폼 비즈니스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공유경제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향한 여정에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공유 경제 수단이 기존 방식에 비해 사회 전체의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감소시켜야 한다. 둘째, 추가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거나 최소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기타 물리적 안전, 고용 안정, 개인 정보 보호, 기타 사회 문제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 중에서도 외부효과 감소는 공유경제로부터의 기대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외부효과는 실제로 비용을 발생시킨 경제주체(기업)가 그 비용을 사회에 전가한 부분이다. 환경파괴, 과도한 탄소배출, 사회문제 야기, 공공 보건과 건강 훼손, 소득불평등 심화 등이 전가된 사회 비용(social cost)의 예가 될 것이다.
블룸버그(Bloomberg Business Week)는 지난해 9월 30일 공유택시(라이드헤일링) 서비스의 외부효과를 계산한 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그 기사에 의하면 10여년 전 우버와 리프트가 개인의 승용차 사용을 줄여 공공 운송수단 사용을 촉진하고 교통체증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공언하였지만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라이드헤일링 이후 교통체증이 오히려 늘었고 공공 운송수단 사용은 오히려 줄었다. 우버와 리프트의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한다고 가정해도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다.
미국의 주요 6개 대도시에서 10만회에 해당하는 운송(trip)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개인이 승용차 대신 운송네트웍회사(TNC)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회 운송의 사회 비용이 30~35% 증가한 대략 35센트의 추가적 사회 비용이 발생했다. 라이드헤일링이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긴 하지만 사망자 증가와 운송 서비스 간 대기 시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나타난 결과다.
최소한 도시지역에서는 자동차 소유 개념이 사라지고 공유 서비스로 대체될 것이라는 공유경제 옹호론자들의 주장이 현실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점점 더 플랫폼 비즈니스로 변화해 가는 공유경제가 시장자본주의를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동시에 배달의 민족 라이더들과 같이 임시직 프리랜서인 긱 노동자(gig worker)를 양산해 내는 플랫폼 공유경제 모형에 대한 사회적 보완 제도를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미시적 차원의 투자 전략인 ESG 논의도 필요하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찾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김종대 인하대 녹색금융대학원 주임교수(지속가능경영연구소 ESG 센터장)
● 김종대 인하대 녹색금융대학원 주임교수 프로필
현재 인하대 지속가능경영연구소의 ESG 센터장. 국내 최초로 대학원 지속가능경영·녹색금융 전공을 개설해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속가능경영 관련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한국환경경영학회 창립인으로서 회장을 역임했고,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전문위원과 인천시 녹색성장위원장 등을 지내기도 했다. 대표 저서로는 <책임지고 돈 버는 기업들> 등이 있다.
김종대 인하대 녹색금융대학원 주임교수

